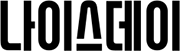|
기술 고도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기존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세금의 중심도 임금이 아닌 기업의 AI 수익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최근 발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5년 10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일반지능(AGI) 시대의 불가피한 재정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더욱 중요해진 정부 재정의 역할' 보고서를 냈다.
우선 김정훈 원장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고령화가 맞물리며 경제·재정의 기본 구조가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AI에 의한 일자리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AGI 고도화가 임금과 국내총생산(GDP)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유토피아가 펼쳐지면 문제없지만, 일자리는 소멸하고 GDP만 증가하는 미증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현재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구조적 총수요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1990년대 일본처럼 내수 부진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AI 경제학자인 안톤 코리넥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의 NBER 논문(2024)을 인용해 AI 발전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시나리오 1'은 AI가 일부 과업을 자동화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경우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임금과 GDP가 꾸준히 상승하는 '유토피아형' 미래다.
'시나리오 2'는 약 20년 내 대부분의 과업이 자동화돼 일자리 소멸이 본격화되는 경우로, GDP는 급증하지만 일자리가 사라져 노동소득은 급감하는 경우다.
'시나리오 3'은 불과 5년 내 완전 자동화가 이뤄지는 급격한 변화로, 'AI 이윤이 GDP를 독식하는 초격차 사회'가 전개된다.
김 원장은 "현실 경제의 향후 궤도는 이 세 시나리오의 중간쯤에 위치할 것"이라며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재정정책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장은 AI 발전으로 GDP가 크게 증가하면서도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정부의 과세 기반은 소득세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노동소득'에서 '기업의 AI 이윤'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결국 현재의 조세 체계도 인간 노동 중심에서 AI 자본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AI가 노동을 대체하면 재정정책 기반이 노동소득에서 AI 이윤으로 옮겨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한국이 이처럼 AI·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AI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재정 기득권을 재정수요에 기반한 지출로 전환하는 재정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원장은 "AI 시대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총수요 부족과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응해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정책 및 일정 수준의 국가부채 증가가 필요하다"며 "만약 AI 기술의 발전으로 GDP 증가율이 높아진다면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국세수입 비율로 지출을 무조건 보장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재정 기득권을 재정수요에 기반한 지출로 전환하는 재정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25.12.23 (화) 14:51
2025.12.23 (화)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