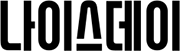|
정부는 경기 부진의 흐름 속에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 청년의 지방 기피·워라벨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고용률은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청년층의 취업지표는 악화를 지속하는 양상이다.
11일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p) 떨어졌다.
청년 고용률이 전년보다 감소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16개월째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 중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를 보면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4년 3개월) 연속 청년 고용률이 하락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확산했던 시기다.
이후에도 청년 고용률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4개월 연속,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근래 가장 큰 경기 침체기였던 코로나19 때보다 고용률 감소세가 더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청년 고용률 장기 하락의 국면은 최근 경기 국면과도 닮아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진 청년 고용률 하락은 단순히 경기침체 탓만이 아니었다. 당시에도 제조업 자동화와 정보통신(IT) 기술 확산으로 저숙련 청년층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다.
많은 청년이 대학에 장기간 재학하면서 '쉬었음' 상태가 늘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구직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후 금융위기 충격으로 하락세가 더욱 깊어졌고, 이런 추세 속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이어지며 청년 고용률 하락이 연이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하락세 역시 경기 부진에 더해 고학력화가 고착된 상태에서 채용 트렌드 변화와 미스매치가 겹치며 나타난 구조적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률이라는 건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며 "이번 하락세는 취업 시장의 변화와 기업들의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확대, 청년층의 지방 기피, 워라벨 선호 등이 맞물리면서 청년층에 불리한 미스매치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의 고용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1만6000명 줄었고, 전문과학업은 전년보다 3만1000명 늘었으나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반면 보건복지업은 30만4000명 늘며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비중 높은 산업군에서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계속 청년층 고용률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청년 맞춤형 고용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AI 지원 강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 2배 등 대책도 마련했다.
장기적으로는 AI 대전환과 혁신경제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당장 효과가 가시화되기는 어렵지만 청년 고용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법으로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2025.12.28 (일) 00:33
2025.12.28 (일) 00:33